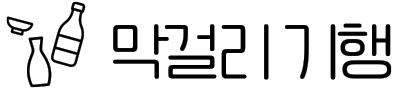막국수와 막걸리(feat.마천골 생막걸리)
"막국수 육수는 뭐로 만들어요? 무슨 맛이 정답인지 모르겠네". 친한 A작가가 뜬금없이 물어봤다. 막국수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육수의 정체가 뭔지 먹는 곳마다 달라서 모르겠다는 것이다.
"막국수 육수에 답이 어딨어. 막 만들어 먹는 게 막국수인데. 맘대로 만들어 국수 말면 그게 막국수 육수지". 막국수 육수의 정답을 모르는 건 당연했다. 강원도 화전민이 쌀이 없어 반죽하기도 힘든 메밀가루를 치대 생존을 위해 '막'해 먹었던 국수가 막국수 아닌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을 위해 세워진 배티 성지는 충북 진천에 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이기도 한 배티성지 주변엔 숯가마들이 유난히 많다. 조선 후기 박해를 피해 진천 산골에 숨어들었던 천주교도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나무를 베어 숯을 구었던 숯가마가 지금까지 유산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막국수 앞에 '춘천'이라는 지명이 종종 붙는 이유도 19세기 을미사변 이후 춘천 지역 의병 가족들이 깊은 산골로 숨어 들어가 화전을 일구면서 국수를 해 먹었다는 이유에서다. 꼭 이런 역사적 아픔이 배경에 서려있지는 않더라도 막 해 먹던 메밀 국수가 궁핍했던 강원도 첩첩산중의 생활상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니 막국수의 육수가 정확히 정의될 수 없다. 없는 살림에 어찌 육수를 뽑아서 국수를 말았겠는가. 동치미에 말아먹으면 동치미 국물이 육수이고, 간장을 푼 물에 말아먹으면 간장 국물이 육수가 된다. 가평의 송원 막국수는 양념간장에 비벼 먹는 맛이 일품이고, 양양 단양면옥 막국수의 짭조름한 해물 육수 맛은 메밀국수와의 궁합이 기가 막히다. 강원도 고성의 전설인 백촌 막국수는 막국수의 원형이 이러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듯하다. 거칠한 질감이 일품인 메밀국수사리 따로, 양념 명태식해 따로, 쩡한 동치미 국물 한 사발을 따로 내준다. 비벼먹던, 말아먹던 알아서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다. 이렇게 국수를 막 내어주는 집이 기본 2시간 대기이니 '막'돼먹은 식당은 아닐 것이다.

'막'이라는 단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거칠거칠하고 싱싱한 삶이 느껴진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 왔다고 해도 기어코 먼저 먹어버리고 '어 지금 막 시작했어'라는 친구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일을 못하냐'라고 막 지껄이는 상사 같기도 하다. '겉절이 막 무쳤으니 먹어봐'라는 엄마 같기도 하고. '아 몰라. 뭐 어쩌라고'라며 막무가내 성질을 부리는 막내 여동생을 '막'이라는 단어는 닮아있다. 이거 저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 막노동이고, 앞뒤 없이 사고를 치면 인생 막장이다. '막' 같다 붙이지 말라며 타박도 받지만 만만한 미소 한 줌 지어보며 '막' 달라붙어 보는 우리네 일상을 '막'이라는 단어는 품고 있다. 그래서 막국수와 막걸리는 참 많이 닮아있다. 막국수의 거칠지만 생명력 있는 맛은 우걱우걱 막 먹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벌컥벌컥 막 마시고 커~하니 장탄식을 뱉어야 막걸리는 제대로 마신 것 같다. 둘 다 '막'자 돌림의 맛이기 때문이다.
막국수 육수가 뭐냐고 물어봤던 A작가가 경남 함양의 마천골이라는 곳을 다녀오며 선물이라고 지역 막걸리 한 통을 가져다주었다. '지리산 마천골 생막걸리'. 아이고 이 먼 곳의 막걸리를 다 챙겨다 줬냐며 엄청 기뻐하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그 먼데까지 가서 이런 막걸리를 사 오냐'라는 막 돼먹은 생각도 한자리하고 있었다. 마천골 생막걸리 성분표 때문이었다.
원재료 명 및 함량 : 정제수, 팽화미(외국산), 입국(밀, 외국산), 효모, 혼합제제(아밀라아제, 글루코아밀라아제, 황산칼슘, 탄산칼슘), 아세설팜칼륨(감미료), 사카린나트륨(감미료)
매년 10월이면 토종 흑돼지와 산나물 축제가 열리는 지리산 자락 마천골의 막걸리인데 물 빼고는 외국산 재료와 각종 화학 첨가물로 빚어진 막걸리라니. 물론 대부분 지역의 저가 막걸리에는 감미료가 들어간다. 근데 당화 촉진제인 아밀라아제나 글루코아밀라아제가 들어가는 막걸리는 드물뿐더러, 산화 방지제와 보존제로 사용되는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이 들어간 막걸리는 더욱 찾기 힘들다. 이런 성분은 오랜 유통 기간이 필요한 중견 막걸리 회사의 살균 막걸리에 종종 들어가는 성분들이다. 근데 청정 지역 마천골의 생막걸리에서 화학 촉진제와 보존제를 넣었다고 하니 흠칫할 수밖에. '에잉 이런 막 담근 술 같으니'. 스팸 몇 조각 잘라서 무덤덤하게 한 잔 걸쳐 보았다. 어라, 이건 뭐지?

막국수의 '막'이나 막걸리의 '막'이나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바로 막 만들어 냈다는 의미와 거칠게 막 만들었다는 의미가 막국수와 막걸리의 '막'자에 배어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전적으로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이다. 막국수의 주재료인 메밀 반죽은 밀가루 반죽과는 차원이 다르다. 잘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익반죽을 하는데 어깨가 빠질 정도로 힘을 써 치대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를 않는다.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막걸리를 빚기 전에 쌀을 씻는 과정을 백세(百洒)한다고 한다. 쌀을 백번 씻는다는 의미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뜻이고, 실제로 쌀 한 말을 수십 번 씻으려면 허리가 끊어져 나가 버릴 것만 같다. 들이는 공을 생각하면 막국수나 막걸리에 붙어있는 '막'자는 참 달갑지 않다. 소설가 성석제는 음식 에세이 [칼과 황홀]에서 할머니의 막걸리를 추억한다.
할머니는 막걸리에 물을 더 부어댄다. "일하면서 술기운만 실쩍(슬쩍) 맛을 보고 힘이 나마 됐지, 뭘. 취해서 지정(주정)하려고 술 처먹나"... 막걸리는 술이면서 밥이었고 안주를 따로 시킬 필요 없어 경제적이었다... 막걸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이나 운동으로 땀을 흘린 뒤에 마시는 생활의 술이다. - 성석제 [칼과 황홀]
하루를 털어내기 위해서 소주를 마시고,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고, 하루를 취하기 위해 위스키를 마시지만 막걸리는 그냥 거기에 있기에 오다가다 마시는 술이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내 호주머니가 허약해도, 별 다른 구실이 없어도 밥처럼 물처럼 곁에 두게 되는 편한 술이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말아먹든 비벼 먹든 상관없는 화전민의 막국수나, 밥처럼 먹던 물처럼 먹든 간에 혹은 새참에 마시든 저녁 밥상에 마시든 상관없는 막걸리의 '막'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기대감 전혀 없이 마셨던 지리산 마천골 생막걸리가 딱 그랬다. 편안했다.

지리산 마천골 생막걸리는 시큼털털하다. 탄산감도 제법이다. 무엇보다 친화력이 좋다. 시골 장터에서 얼큰히 한잔 걸친 아저씨가 낯선 이에게 순대 한 접시와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며 환희 웃는 인심이 막걸리에 녹아있다. 합성 감미료를 두 종류나 넣지만 달지가 않고 맑다. 미원을 한 수저 듬뿍 넣지만 구수함만 가득한 시골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닮았다. 그래서일까, 안주로 한 점 베어 물은 스팸이 비릿하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안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냉장고에 가득하다.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지역 채널의 휴먼 다큐에서 어떤 시골 할아버지의 일상을 본 적이 있다. 막걸리를 좋아해서 할머니 속 꽤나 썩이시는 캐릭터였다. 부뚜막에 막걸리를 올려놓고 지나가다 한 잔, 일하고 와서 한 잔, 마실 나가기 전에 또 한 잔이다. 차가우면 속 버린다고 늘 막걸리는 부뚜막 위에서 미지근하게 보관을 하고 절대로 빈 속에 술을 붓지 않는다. 찬장에 총각김치가 있으면 그것이 안주고, 나물 무침이 있으면 그것이, 두부 부침이 있으면 그게 또 안주다. 밥상에 올릴 수 있는 모든 반찬이 할아버지 막걸리의 안주였다. 대단함도 특별함도 없는 일상의 소소한 반찬 모두가 최고의 안주였다. 하긴 생활의 술인 막걸리에 뭐 그리 거창한 안주가 필요하겠는가, 건건이 한 점이면 족할 터인데. 그래서 마천골 생막걸리 옆에서 스팸을 치웠다. 대신 장조림 한 점을 해보았다, 무말랭이도, 마늘장아찌도, 김자반도 마천골 생막걸리와 함께 해보았다. 모두 좋았다. 손으로 조물조물 거려 만든 건건이 반찬이면 다 안성맞춤이었다. 마천골 생막걸리 옆에는 웬만한 반찬을 막 같다 놓아도 다 붙을 것 같았다. 낯가림 없는 편안한 막걸리였다. 그 편안함에 취하니 또 하루가 저물어 갔다. 생활의 술이라는 막걸리는 이런 것 같았다.
아! 지리산 마천골 생막걸리는 자매품도 있다. 지리산 마천골 동동주다. 지금까지 본 탁주 중 가장 귀여운 병 디자인을 갖고 있다. 맛은 차이가 거의 없다. 자매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