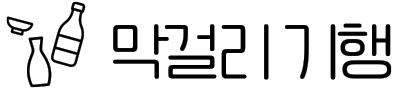멀기에 더 그리운 수덕산 생막걸리
서울 기준으로 고흥은 참 먼 곳이다. 한 참을 달리고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고흥은 먼 거리를 달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멋지고 다양한 맛을 품고 있다. 땅이 좋으니 갈비탕이 좋고, 바다가 좋으니 삼치회가 좋다. 뻘도 좋으니 꼬막이 환상이다. 이 모든 맛을 값싸고 푸짐히 보듬을 수 있는 백반은 더 좋다.
단 돈 만 원에 20여 가지 고흥의 산해진미를 내어주는 덕원면의 다미식당은 넉넉한 고흥밥상에서도 으뜸인 백반집이다. 마음씨 좋은 여주인장과 노모의 손맛이 가득 차려빈 만 원 백반 한상을 한껏 즐기고 나오면, 길 건너 작은 구멍가게가 보인다. 만물상회. 구멍처럼 작은 만물상회에 들어가니 주인장은 외출중이다. 불러도 대답없는 주인장을 기다리며 만물상회를 둘러본다. 과자 여남은 봉이 선반위에 뒹굴고, 냉장고에는 달랑 막걸리 4통이 들어있다. 더 기다려봐야 주인장은 올 것같지 않다.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통을 꺼내어 들고, 선반 위에 2000원을 올려 놓는다. 수덕산 생막걸리. 이 녀석은 그렇게 만났다.

첫 잔
와우! 달지않고 청량하다. 탄산이 의외로 강하고, 단맛이 완벽히 제어되고 있다. 누룩 특유의 쿰쿰함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옅은 산미와 쌉싸름함이 막걸리 맛의 주류를 이룬다. 세련된 맛이다. 달달한 막걸리를 넘어 좋은 술을 만났다. 시골 구멍가게에 이런 멋진 녀석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고흥의 만물상회에서 보물을 건졌다. 수덕산 생막걸리의 태그를 보면 '3대를 이어온 도가'라며 '신호식'이라는 술빚은 분의 이름이 프린트되어 있다. 처음 태그를 봤을 때 '마케팅인가?'라고 생각했다. 아니다. 자존심이다.
둘째 잔
옅은 산미와 쌉싸름함이 멋지게 발란스를 이룬다. 충분히 식힌 후 마셔서 그런지 단맛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다. 차고, 깔끔하고, 청량감있는 산미의 막걸리다. 성분표에는 감미료가 표기되어있지만 맛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잘 발효시킨 막걸리다. 고흥은 이런 식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만남이 고흥에는 있다. 40년 전에도 그랬다.
온 가족이 여름 휴가 차 고흥 나로도 행 배를 탄 적이 있다. 지금이야 다리 건너 쉽게 갈 수 있는 나로도지만, 40년 전만해도 배를 타고 4시간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고흥은 다도해 국립공원의 중심이다. 항구를 출발한 배는 고흥 앞 바다 온갖 섬을 들렸다 가니, 에어컨도 없는 좁은 선실에 몸을 구겨 놓고, 바다 바람으로 땀을 식혀가는 고흥 바닷길은 초등학생이 버티기에는 제법 모질고 긴 길이었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치기 전에는.

셋째 잔
매운 맛이 강한 무말랭이와 마시니 막걸리 맛이 심심해진다. 짙고 농밀한 맛의 특성을 지닌 녀석은 아니기 때문이다. 농도도 맑고, 단맛도 적절히 제어되어 술맛이 맑다. 누룩의 은은한 향도 느껴지지 않는 건 기호에 따라 아쉬움일 수 있지만, 그만큼 깔끔한 술맛을 찾아낸 건 주조시 선택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 정도의 술맛은 대단한 노력과 기술이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강한 안주와 합을 마추면서 술맛이 심심하다 할 것이 아니라, 걸맞는 안주를 함께하면 될 문제이다.
넷째 잔
막걸리가 술술 들어간다. 탁주가 탁하지 않으니 물 마시는 기분도 들지만, 은근히 취해가는 걸로 보아 요 놈도 도수가 6도 이상일거로 짐작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보통 막걸리는 탁주 원액에 물을 섞어서 시판이 된다. 이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를 떨어뜨리는데, 대부분이 6도에 맞춰서 판매되고 있다(탁주 원액은 발효 공정에 따라 12~18도 정도의 도수를 갖는다). 근데 이마저도 저도수 술을 찾는 소주 트렌드 때문인지 5도까지 도수를 낮춘 막걸리가 시판이 되고, 제법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현상이다. 도수가 낮아지면서 쌉싸름한 본연의 술맛은 낮아지고, 단맛과 청량감이 막걸리의 본연의 맛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이다. 고흥의 수덕산 생막걸리를 입 안에서 한바퀴 돌리면 천천히 음미한다. 쌉싸름한 술맛이 입천장을 툭하고 치는게 느껴진다. 하!! 요 놈은 술이다.

남해의 푸른 바다도 덥고 지겨워 선실 창 문에 머리를 내밀고 용틀임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선실 객석 앞 자리. 바로 내 앞 자리에 한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단발 머리의 그녀도 무더운 지겨움에 얕은 한 숨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고, 창문에 머리를 빼고 그녀를 지켜보던 나와 눈이 마주쳤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녀는 같은 반, 여학생 H였다. 하얀 피부와 찰랑찰랑한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 공부도 제법 잘했고, 옷도 예쁘게 입어서 반 남학생들이 제법 좋아했고, 특히 내가 좋아했던 그녀를, 집에서 300Km가 훌쩍 넘는 이곳 고흥 앞 바다, 좁고 무더워서 땀 내 가득한 선실 안에서 만난 것이다. 나는 당황했고, 그녀도 당연히 당황한 눈치였다. 그리고 그 걸로 끝이었다. 그 순간 세상 제일 예쁜 소녀가 내 눈 앞에 있는데, 내가 좋아했던 그녀가 앞 자리에 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우연함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눈 앞에 있는 그녀만큼이나, 내 옆의 부모님과 그녀 옆의 부모님이 더 신경이 쓰였다. 말을 붙이는 순간, 이런 우연이 어디냐며 부모님들끼리 말을 트고, 수다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 더 쑥쓰러워질 내 모습을 혼자 상상하며 단 아무 말도 못하고 남해 바다만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색함이 창궐하니, 무더위를 못느끼는 신비한 체험이 가능해진다. 난 창 밖 바다만 바라볼 뿐이였고, 그녀는 혹시나 눈이 또 마주칠까 앞 좌석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말 한마디 던져볼까’, ‘어깨라도 톡하고 쳐볼까’, ‘미소라도 지어볼까’ 등등. 아는 체의 모든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나의 시선은 푸른 고흥 앞 바다에만 머물 뿐 쉽게 앞을 향하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훅하니 흘러 버렸다. 내가 좋아했던, 어마어마한 우연속에 바다 위에서 만났던 그녀는 이름 모를 고흥 앞 바다 한 섬에서 먼저 하선해버렸고, 그 때까지 말도, 눈짓도, 미소도 짓지 못한 나는 배에서 내리는 그녀를, 뜨거운 여름 햇볕과 푸르디 푸른 고흥 바다를 배경 삼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개학 후에도, 졸업 후에도 쭈욱 바라만 볼 뿐이었다.
다섯째 잔
맛이 유지가 된다. 탄산은 빠졌지만 청량감은 여전하다. 마지막 진이여서 술의 찬 기운이 사라지니 살짝 단맛이 느껴진다. 아주 살짝. 대신 산미도 함께 높아져서 맛의 균형감이 깨지지 않는다. 좋다. 술같은 막걸리를 오랜만에 만났다. 이 녀석을 한 병만 가져온게 원통하다. 고흥은 너무 멀다. 멀기에 넉넉히 가져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아꼈을까 후회된다. 40년 전 고흥 앞바다의 추억처럼.
승발이 맛평가(5점 만점) : 맑고 쌉싸름한 청량감이 산미와 멋드러지게 조화를 이룬 술맛. 팽화미로도 이런 멋진 술이 나올 수 있음을 알았다. 막걸리의 단맛을 선호하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4.5점.
어울리는 맛과 멋 : 여름이라면 막걸리 식초를 더해 가볍게 무쳐낸 잡어회 무침과 함께, 겨울이라면 고흥 별미인 삼치회와 한잔하면 기가 막히다. 특히 부드러운 삼치회에 초된장 살짝 찍어, 갓김치와 곁들인 후 수덕산 막걸리 한 잔은 최고의 궁합. 여기에 맑고 가볍지만 씁쓸한 POCO의 Sea of Heatbreak를 함께하면 환상이다.